[문학 속 가정 이야기] 이불 ‘안’은 위험해!
《데미안》

[노동욱 스미스학부대학 교수, 문학사상 편집기획위원]
상상해 보라! 한겨울에 따듯한 이불 속에 엎드려 있다.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 온수매트의 온기.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혹은 넷플릭스. 거기에 귤이 한 아름 담긴 바구니까지.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그 안락함과 평온함에 파묻히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네 삶이란 늘 이런 소소한 여유조차 사치일 만큼 녹록지 않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 화자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눈 덮인 숲을 조용히 관조한다. 들리는 것이라곤 오로지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눈송이 흩날리는 소리뿐. 화자는 눈 내리는 저녁 적막한 숲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언제까지고 멈춰 서서 이를 바라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promises to keep)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그에게는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miles to go before I sleep)이 있다.
따듯한 이불로 나 자신을 돌돌 말아 꽁꽁 싸매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슬프게도 내게는 늘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릿속에 되뇌인다. “나는 힘겹게 투쟁하여 이불에서 나온다. 이불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저 유명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Demian)》의 한 구절을 패러디한 것이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알’이라고 하는 세계를 깨뜨려야만 비로소 한 마리 새로 거듭나 창공을 자유로이 훨훨 날 수 있다.
그런데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힘겨운 투쟁’에 비유될 정도로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뭘까? 알 껍질이 단단해서일까? 그보다는 알 속이 너무나도 따듯하고 안락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 따듯하고 안락한 알을 ‘스스로’ 깨뜨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알을 깨뜨리는 작업이 곧 힘겨운 투쟁에 비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 깨뜨려야만 새가 될 수 있지, 남이 깨뜨리면 곧장 ‘계란 프라이’가 되어 버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새에게 너무 따듯하고 안락한 환경은 그로 하여금 새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린 매일 아침, 잠의 유혹을 떨궈내고 깨어나, 따듯하고 안락한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것일 게다. 알을 스스로 깨뜨리지 못한 새는 알 속에서 괴사하고 만다. 새를 따듯하고 안락하게 보호해 주는 ‘알’이라는 세계가 역설적으로 새를 ‘죽이는’ 공간이 되고 만다. 그렇다. 따듯한 알 속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에게 이불 ‘안’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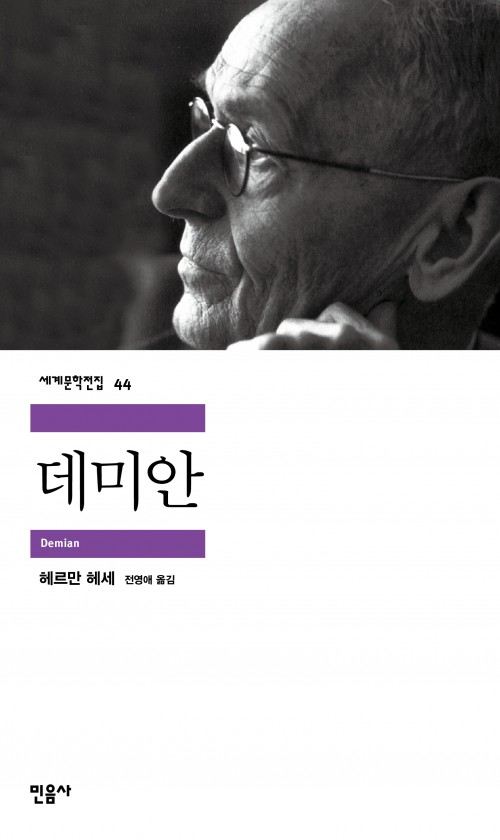
매미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어릴 적 여느 아이들처럼 곤충채집망을 들고 매미를 잡으러 그 울음소리를 쫓아다녔더랬다. 찢어질 듯 울어 제치는 매미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 매미는 다른 곤충에 비해 찾기 쉽고 잡기 쉬운 곤충이었다. 한편으론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매미가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매미의 일생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는, 매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매미는 성충이 되기 위해 유충으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5번의 탈피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7년 만에 마지막 허물을 벗고 나온 매미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곤 불과 2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컷 매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죽어라 울어 댄다. 그것은 짝짓기를 위한 처절한 울음이다. 죽어라 울어 대서 힘들었는지, 매미는 씨를 뿌리고 그렇게 죽어 간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씨를 뿌리기 위해 죽어라 울어 대는 매미의 모습이 맹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허망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매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일생을 거칠게 요약해 보면, 결국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생동안 무언가를 이뤄 내기 위해 죽어라 울어 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아닌가? 아니, 우리 인생이 꼭 매미의 그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이뤄 내기 위해 매미만큼이나 그토록 간절하고 처절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매미에게 ‘허물’은 하나의 ‘세계’였을 것이다. 구태여 허물을 벗고 나와 고된 여름을 살아 내야 하는 그 엄연한 탄생을 앞둔 매미에게, 허물 속은 차라리 따듯한 이불과도 같은 안락한 공간이었으리라. 하지만 매미는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일생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힘겹게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성장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매미의 울음소리는 내게 더 이상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었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애처롭지만 숭고한 소리였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소리였다.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매미를 잡으러 다니지 않는다. 그가 그토록 숭고한 울음소리를 원 없이 내다 갈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 그의 울음소리를 존중심을 담아 귀 기울여 들으며, 그에게서 삶과 죽음을 배운다. 자기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울어 대는 모든 존재는 신비롭고 경이롭다. 그러니 우리, 처절하게 울어 대는, 우리 앞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기로 하자.
‘알’이라는 세계를 ‘이불’이라는 일차원적 공간으로 한정해서 비유하지 않고, 우리의 사고나 관념 등으로 환원해 본다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데미안》은 자신의 사고나 관념을 단단한 알 껍질로 형성하여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一針)이다. 내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요즘 말로 ‘꼰대’는 바로 스스로 알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탄생하지 않으려 하는 새와 같다. 《데미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장소설’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방황하는 청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는 《데미안》의 한 단면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성장은 물리적 나이와 크게 상관없다. 모든 존재는 정신적·영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 성장에는 나이가 없다. 《데미안》은 방황하는 청춘을 위한 소설이 아니라, 안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소설이다.
월간 <가정과 건강> 12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