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속 가정 이야기] 모두가 나의 아들

[노동욱 스미스학부대학 교수 / 문학사상 편집기획위원]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정연의 아들은 6년 전 실종되었다. 실종된 아들의 행방을 애타게 찾던 중 그녀는 아들과 생김새가 똑같고 심지어 흉터까지 똑같은 아이를 봤다는 제보를 받게 된다. 정연은 지체 없이 혈혈단신 그 낯선 곳으로 향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아들을 찾게 되는데 그는 결국 죽은 채로 개펄에서 발견된다. 정연은 개펄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그 아이의 발톱은 자신의 아들이 가진 특유의 발톱 모양과 달랐다. 정연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한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정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죽음은 실종된 아들을 둔 정연의 마음에 자기 아들의 죽음과도 같은 가슴 찢어지는 슬픔으로 다가온다. 다른 아이의 죽음이 내 아이의 죽음처럼 다가오는 이 극적인 공감의 순간은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아서 밀러의 『모두가 나의 아들』
영화 《나를 찾아줘》는 ‘나의’ 아들/‘너의’ 아들이라는 이분법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런 점에서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희곡 『모두가 나의 아들(All My Sons)』은 제목부터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다. 전쟁 당시 조 켈러는 전투기 부품을 군납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쟁 당시 발생한 전투기 사고와 관련이 있다. 조 켈러는 결함 있는 부품을 공군에 납품함으로써 전투기 스물한 대가 추락하여 조종사 스물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다. 조 켈러는 군의 독촉에 못 이겨 부득이하게 결함이 있는 실린더 헤드를 급하게 납품한다.
그러나 그 행위의 이면에는 ‘끔찍한’ 자식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납품을 제때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것이고, 따라서 아들들에게 물려줄 사업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다른 사람의 아들 스물한 명의 목숨을 앗아 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조 켈러의 둘째 아들 래리는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비행기 사고를 일으켜 생을 마감한다.
래리가 자살 비행을 감행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래리 자신만 아버지 조 켈러의 아들이 아니라 전투기 사고로 사망한 스물한 명의 꽃다운 청춘 모두 조 켈러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래리가 남긴 유서를 읽은 조 켈러는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 “물론이지. 그 애는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래리는 그들 모두가 내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생각에도 그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 같군. 그들이 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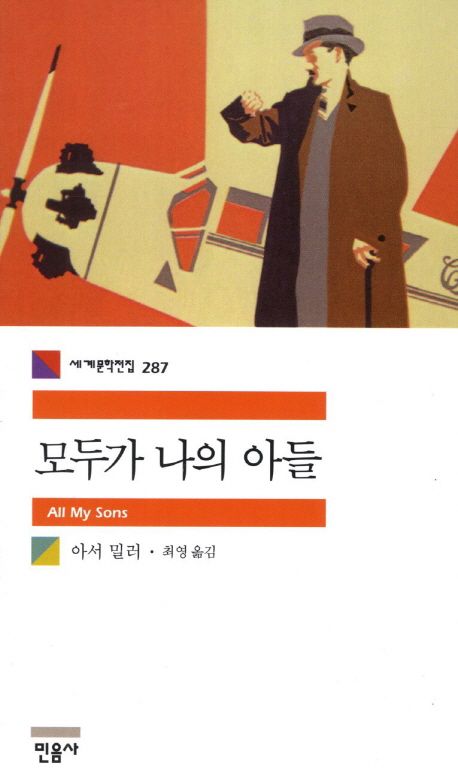
우리는 자기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는 ‘끔찍하게’ 괴롭히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최근 큰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재준은 학창 시절 동은을 끔찍하게 괴롭힌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난 그들. 그 즈음, 재준은 자신의 딸 예솔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 있다. 동은은 재준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모르는 것 같아 알려 주는데,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거든, 재준아.” 재준과 같은 ‘괴물’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재준의 진정한 ‘괴물성’은 사실 그의 잔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내 자식 사랑’과 ‘끔찍한 남의 자식 괴롭히기’라는 크나큰 간극 속에 존재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
2006년 어느 여름밤, 여덟 살 소년 카일 홀트러스트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 트럭은 소년을 9m 정도 끌고 갔다. 목격자였던 토머스 보일 주니어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트럭 앞쪽을 움켜쥐고 들어 올려 소년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무려 45초간 잡고 있었다. 그 트럭의 무게는 약 1,500~1,800kg 정도였다.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이 500kg이라고 하니 보일은 그날 역도 세계 챔피언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묻자 보일은 “지금은 저 차를 절대 들어 올릴 수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자 보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저 애가 내 아들이라면?”
위에 제시한 일화는 조너선 사프란 포어(Jonathan Safran Foer)가 『우리가 날씨다(We Are the Weather)』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화다. 트럭에 깔린 소년이 ‘내 아들 같아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기적적으로 구출해 낸 이 일화는 그 자체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포어가 이 일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포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아들 같아서’ 혹은 ‘내 딸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내 아들 같아서’ 혹은 ‘내 딸 같아서’라는 말조차도 매우 자기중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포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을지도 몰라서 구급차가 올 때 길을 비켜 주는 것이 아니다.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길을 비키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비켜 주는 것이다.”
모두가 나의 아들딸이라고 여기며 타인을 귀히 여길 때, 아니 모두가 나의 아들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느낄 때 세상은 조금 더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나의 아들』 속의 대사는 이런 점에서 곱씹어 볼 만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아는 것 말이에요.”
월간 <가정과 건강>


